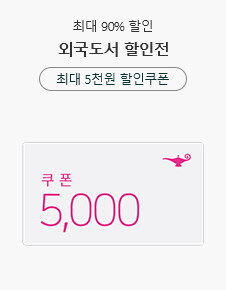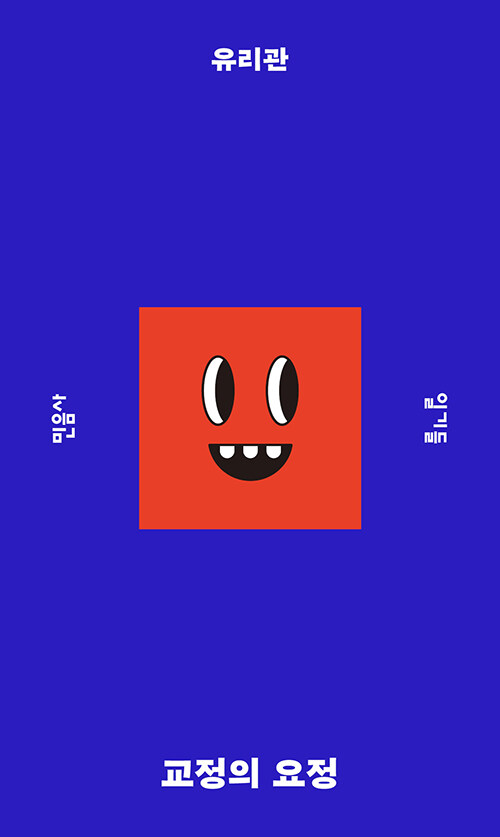교정교열자의 업무는 지옥에서의 밭 갈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감히 가능하게 하려고, 무한한 책임 영원한 책임으로 홀로 떠맡는 것이다. (……) 이 세상이 다 틀려도 내가 교정공으로서 딱 하나를 교정할 수 있다고 하면 ‘든과 던’이다. 든과 던을 모두 고치고 난 뒤, 욕심 많은 내가 눈물로 엎드려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빌고 울고불고 손을 깨물고 발을 깨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더 고칠 수 있다면 단연 ‘로써와 로서’다. 둘은 아주 다른 단어인데 또 많이 혼동된다. 끼새수교들 원고에서도 보면 백중팔십이 반드시 틀리고 넘어가는 오류 맛집으로서, 내 생각에는, 자기 노동에 있어 언어를 주요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한다. 나는 뭐 어려운 얘기까지 안 한다. 우린 야만스러운 저 교수 녀석들과 달라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 「로써와 로서의 구분」
교정의 요정. 유리관 지음이 책의 한 문장
선진국의 우리는 산다는 것과 경제가 격리되어 있는 듯한, 거대한 허구의 세계 시스템에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같다. ‘현대스러움’과 근원적인 경제의 논리가 인류사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청킹맨션의 탄자니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미래 인류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이들, 공유·연결·특이점·기본 소득에 관심을 두는 모든 이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들은 ‘아무도 신용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호수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과 생활 보장 구조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청킹맨션의 보스는 알고 있다. 오가와 사야카 지음, 지비원 옮김그리하여 아렌트는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익명의 무국적자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나중에 “시민권의 상실은 사람들에게서 보호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확립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원조차도 모조리 박탈했다”고 고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명성”(“이름 없는 방대한 군중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조해줄 만큼 탁월한”)만이 안전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유명한 난민의 처지가 향상될 가능성이란, 그저 일반적인 떠돌이 개에 비해 품종견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_ 제5장 ‘추방자와 무국적자’ 중에서
여행 면허. 패트릭 빅스비 지음, 박중서 옮김그는 고리에 검지를 끼워 통조림을 열었다. 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반쯤 열었을 때, 이림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는 통조림의 틈새에 눈을 대고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내부는 빛이 닿지 않는 동굴처럼 어둡기만 했다. 안쪽에 반딧불이의 빛보다 작은,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떠돌았고 어렴풋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뚜껑을 완전히 당겨 열었다. 깜빡이는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추었다. -조예은, 「코티지」
믿을 구석 The Last Resort. 김멜라 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