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 배송
- 마이클 이스터 (지은이),김원진 (옮긴이)수오서재2025-06-24원제 : The Comfort Crisis
 |
이전
다음
2025년 인문학 분야 4위
- 배송료
- [중고] 편안함의 습격 -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들에 관하여
- 14,200원 (정가대비 35% 할인) [중고-최상]
판매완료되었습니다.판매완료되었습니다.- US, 해외배송불가, 판매자 직접배송
- 중고샵 회원간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으로, 중개 시스템만 제공하는 알라딘에서는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sujifan (개인)
- 구매만족도 100.0%






- 최근 6개월, 3개 평가
- 평균 출고일 2일 이내

- [중고] 메타파워
- 10,900원

- [중고] 왜 글은 쓴다고 해가지고
- 4,300원

- [중고] 몰입의 기술
- 9,400원
편집장의 선택
편집장의 선택
"컴포트 존을 벗어날 때 얻는 것들"
신체를 둘러싼 환경만 생각했을 때, 세상은 나날이 편해지기만 한다. 당장 10년, 20년 전과 비교만 해봐도 그렇다. 여름의 실내는 시원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고 겨울의 실내는 어딜 가나 후끈후끈하다. 배달 앱이 생기기 전엔 손가락 까딱으로 집 앞까지 음식이 오는 일은 없었다.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확인하고 시간 맞추어 정류장으로 나가는 일도 언감생심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럼 몸이 편해진 만큼 정신도 여유로워졌을까? 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뇌는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러니 절대적으로 좋아진 환경에서도 정신은 새로운 불편함을 찾는다고.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과도하게 편안해진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불편함을 찾는 뇌의 본능으로 인해 우리의 '컴포트 존'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 저자 마이클 이스터는 여러 실험과 과학적 데이터들을 인용하며 우리가 몸의 편안함을 끝없이 추구한 대가로 정신의 평안을 해치게 되었다고 말한다. 현대인의 수많은 정신 질환과 무기력, 스트레스 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자신이 편안한 삶 속에서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마이클 이스터는 불편함의 효용과 자연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오지로 향한다. 알래스카 툰드라에서 그는 순록 사냥을 하며 야생으로의 회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생생히 전달한다.
33일간의 오지 체험은 평범한 독자들에겐 다소 비현실적이고 비약적인 측면이 있지만, 불편함으로부터 그가 깨달은 것들은 편안함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 편안함의 늪을 박차고 나와 자연과 불편함, 따분함과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은 강렬하고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삶이 자꾸 겉도는 느낌을 받는다면 일단 이 책을 펴보길 바란다. 예상치 못했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인문 MD 김경영 (2025.07.22)
출판사 제공 카드리뷰
출판사 제공 카드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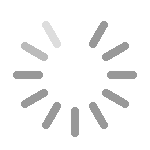



![[중고] 편안함의 습격](https://image.aladin.co.kr/product/36612/28/cover500/k20203086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