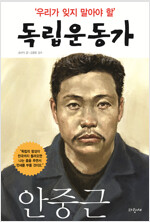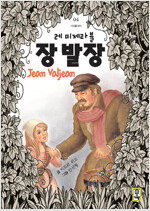|
- 새상품
- 판매가8,000원 (정가대비 33% 할인)
-
6,800원
- 상품 상태중
- 배송료택배 4,500원, 도서/산간 5,000원
- 판매자
- 출고예상일통상 5일 이내
- [중고] 닮은 건 모두 아프고 달리아꽃만 붉었다
- 8,000원 (정가대비 33% 할인) [중고-중]
- US, 해외배송불가, 판매자 직접배송
- 택배비 및 박스 포장 문제로 5권 이상 대량 주문 시 합배송이 어렵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선 상담 문의가 급증하여 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실 경우,원활한 상담을 위해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순차 대응해드리겠습니다. - 중고샵 회원간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으로, 중개 시스템만 제공하는 알라딘에서는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새책 | eBook | 알라딘 직접배송 중고 | 이 광활한 우주점 (9) | 판매자 중고 (8) |
| 10,800원 | 출간알림 신청 | - | 7,200원 | 6,100원 |
“우리 사이에서 꽃은 그대로였고
우리의 절반만 각자의 빛깔로 퇴색되고 있었다”
달리아꽃의 붉은 빛깔에서 시작된 어긋난 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각들이 다시 피어난다
권기덕 시인의 시집 『닮은 건 모두 아프고 달리아꽃만 붉었다』가 걷는사람 시인선 126번째 시집으로 출간되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라디오에서 외계外界의 말을 듣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너의 말은 오히려 도시의 작은 화분이 되고 싶다는 것처럼 들려”(「수목장」)라는 구절처럼, 죽음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언어와 감각의 새로운 조율 방식으로 제시한다. 죽음은 여기서 삶의 종말이 아니라, 삶을 닮은 또 하나의 질서이자 반복되는 감각의 기입이다. 문학평론가 김익균은 이 시집을 죽음은 이번 시집 전체를 통어하는 상징의 차원으로 올라선 작품이라 평하며, 시적 반복과 어긋남, 실패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언어의 리듬과 긴장에 주목한다.
삶은 이 시집에서 더 이상 본래적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꽃 모양을 흉내”(「겨울 해변의 늪」) 내는, 흉내와 반복의 언어적 상태다. “지난 계절의 이팝나무를 보면서 죽은 사람도 사람이라 국어사전을 뒤적거렸다.”(「장마」)라는 시구처럼, 살아 있음이란 죽음의 반대가 아니라 죽음을 ‘닮은’ 상태다. 이 닮음은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어긋난 반복, 실패한 흉내이다. “순대국밥을 먹다가 네 부고를 전해 받았다. 온종일 비가 내렸다. 신을 모르면서 신인 척, 의자를 모르면서 의자인 척, 부추를 먹는다.”라는 고백에서처럼, 살아 있음은 언제나 죽음과 맞닿은 색조를 가진다.
권기덕의 문장은 종종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고, 시간과 논리가 단절된다. “트랙 위에서 그림자가 돈다 묻은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심장으로 변해 간다”(「오르골」)는 풍경이 아니라 감각 그 자체의 기형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부적절한 주술관계는 오류가 아닌 의도된 파열이며, 그 틈에서 독자는 다시 말을 시작할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많은 시편에서 말보다 침묵이 앞선다. “잎사귀와 잎사귀를 흔들며 죽은 새를 묻어 준다 나무는 겨울이 채 오기 전에 가벼워져 어디론가 날아갔다 다시 돌아온다”(「오르골」)라는 시구는, 언어가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열리는 감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시집은 말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 해석이 불가능한 경계에 머물며 독자에게 그 너머를 요청한다. 시는 이렇듯 끝내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견디게 한다. “내가 걸어갈 때마다 숲길은 점점 복잡해졌고 새는 사라지고 있었네 비에 젖은 눈물과 눈물에 젖은 비가 섞여 쓴맛이 났네”(「저문 뒤에야 찾아온 사람」)라고 말하는 장면처럼, 감각기관이 기능을 멈춘 뒤에도 남아 있는 기억과 촉의 언어가 이 시집의 깊이를 만든다.
『닮은 건 모두 아프고 달리아꽃만 붉었다』는 독자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 한 마리가 강물 위에 내려앉을 때 가슴을 움켜쥐던 사람은 아직 보여 줄 달이 남았을까?”(「구멍에 내리는 비는 미래를 삼킨다」)라는 장면처럼, 감정과 언어의 소멸과 반복, 그 잔여로 독자를 안내한다. 의미는 완성되지 않으며, 독자는 그 빈자리에서 의미가 머물렀던 흔적을 어루만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시집은 시를 읽는 일이 현실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부단히 복수화하는 생산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권기덕의 시는 현실을 하나의 언어 질서에 종속시키지 않고, 어긋남과 침묵, 실패를 통해 현실을 되읽고 다시 쓰도록 독자에게 제안한다.
죽음의 이미지로 소환되는 고니는, 이 시집에서 날고 있다. 그것도 빙판 위에서 “어긋난 하늘”(「겨울 해변의 늪」)을 향해. 이것은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모순 속에서 이 시집은 죽음과 생, 실패와 반복, 침묵과 언어가 교차하는 지점을 형상화해 낸다. 그것은 설명을 피하고, 완성 대신 균열 속에 머무르는 방식이다.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말을 시작하는 감각, 그것이 이 시집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다.
- 구매만족도 88.0%






- 최근 6개월, 45개 평가
- 평균 출고일 3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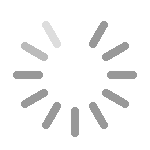



![[중고] 닮은 건 모두 아프고 달리아꽃만 붉었다](https://image.aladin.co.kr/product/36751/77/cover500/k41203019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