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상품
- 판매가11,620원 (정가대비 17% 할인)
-
9,877원
- 상품 상태최상
- 배송료
- 출고예상일통상 72시간 이내
- [중고] 군왕의 비 2
- 11,620원 (정가대비 17% 할인) [중고-최상]
- US, 해외배송불가, 판매자 직접배송
- ♣책 매입(대여점/전집/아동/문제집 제외)
♣대한통운30권이상 착불로 보낼시 택배비무료(메모지에 계좌번호 동봉)
♣주소:155-51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869-6호 지성도서
♣알라딘 입점20년넘은 서점 입니다
99%개인이 보낸 책이나 간혹 오래된 로맨스/만화는 대여점책도 있습니다.
♣가급적구매후 불만시 판매자에게 문의하기에 메모남기시면 즉시 답변
♣모든책과 DVD는 1차:이물질제거 2차:알콜소독 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중고샵 회원간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으로, 중개 시스템만 제공하는 알라딘에서는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경은 잘했더냐?”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율에 몸을 떨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목에 닿은 쇠붙이의 감촉만큼이나 차가웠다.
“저, 그게, 몰래 훔쳐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소리가 나서 다가왔는데요, 그게 보다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를 쏘아보는 남자의 눈빛은 놀랍도록 형형했다.
“아름답다라…… 네 목에 칼을 겨눈 사내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더냐?”
남자의 말투가 어이없다는 듯 변했다. 하지만 유빈의 시선은 남자의 벗은 상체에 고정되어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의 상체는 땀에 젖어서인지, 아니면 달빛 때문인지 빛 가루를 뿌려 놓기라도 한 듯 반짝이고 있었다.
“단지 구경을 한 것뿐인데 행동이 지나치시네요.”
몸에 걸친 옷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지 않았다. 이것을 꿈이라 여긴 탓도 있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인물 같지 않아서였다.
“이곳은 비원이다. 너는 그것을 모르고 이곳에 들었단 말이냐?”
“눈을 떠보니 여기에 있었을 뿐,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유빈은 담담히 대꾸하며 주변을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아까는 이 남자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겨 깨닫지 못했으나, 이곳은 어떤 큰 건물의 뒤뜰쯤으로 보였다.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다? 그래, 어느 전의 나인이냐?”
“네?”
그녀의 목에 겨누고 있던 칼을 거두어 검집에 꽂는 남자의 뜻 모를 질문에 유빈은 잠시 멍해졌다.
“어느 궁에 거하고 있느냔 말이다.”
그녀가 답을 못 하고 우물쭈물하는 게 어이없었는지 남자의 얼굴에 실소가 담겼다.
“아…… 어느 동에 사냐고요? 유익동에 사는데요?”
남자의 얼굴에 미소 비슷한 게 깃들자 그의 인상이 확 바뀌었다. 남자답고 강해 보이기만 하던 이목구비가 유려한 미를 자아내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유익동? 그런 전각명도 있더냐? 그럼 넌 어디 소속인 것이냐?”
“소속은 뭐라 말해야 하나…… 아! 세연 대학교 소속이에요.”
미간을 찡그리며 그녀를 빤히 응시하는 남자에게 뭐라 답을 할까 잠시 고민하던 유빈이 간신히 해답을 내놓았다.
“어찌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더 괴이쩍구나.”
“못 믿으시겠나 본데, 학생증이라도 꺼내 볼까요?”
“학생증이라…… 그것참 난해한 소리구나. 그럼 답하기 쉬운 걸 하문하겠다. 이름이 무엇이냐?”
“유빈, 이유빈이에요.”
남자의 질문은 다행히도 쉬웠다. 그래서 유빈은 분명한 목소리로 답을 했다.
“이런 고얀! 네가 어찌 빈마마란 말이냐?”
또다시 느껴지는 무섭도록 오싹한 기운이 덮칠 듯 다가오자 유빈은 자신도 모르게 늘 위안이 되는 목걸이를 꽉 움켜잡았다.
“억!”
갑자기 느껴지는 현기증에 유빈은 머리를 움켜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잠시 그러고 있으니 현기증이 가라앉았다.
“이, 이런…… 설마 또 꿈이었던 거야?”
조심스레 실눈을 뜬 유빈의 눈이 왕방울만 하게 커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또다시 바뀌어 있었다. 헐벗은 남자도, 시커먼 남자도 없는 이곳은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다.
---------------------------------------------------
“긴말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네가 있던 곳으로…….”
눈빛은 물론 말투까지 변해 버린 천윤의 모습이 유빈의 눈에 시리게 다가와 꽂혔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라 여겼던 유빈이 재차 질문을 했다.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니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라.”
천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빈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원래 세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반겨 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예요.”
간신히 답변을 끄집어낸 유빈이 떨리는 음성을 가다듬으며 대꾸했다. 그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알기 전까진 결코 무너질 수 없었다.
“어째서?”
“그, 그건…… 난 이 나라의 옹주니까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차마 할 수 없는 뒷말을 속으로 삼켜 버린 유빈이 꽤 그럴싸한 말로 끝을 맺었다.
“이곳에서 네가 옹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정 아느냐? 이 나라의 하나뿐인 옹주로서 네가 할 일은 정략혼으로 타국에 팔려 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니 차라리 네 살던 곳으로 돌아가란 말이다!”
냉랭하기만 하던 천윤의 음성이 일순 모든 감정을 드러냈다가 사라졌다.
‘그 때문이었군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가?’
유빈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천윤이 왜 이리 행동하는지 이제야 짐작이 되었다. 자세한 내막까진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자신을 위한 게 분명했다.
“전하, 이곳에 있을지 말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전하께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조금 당돌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은 유빈은 고개를 숙여 버렸다.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날 감정을 그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을 담담한 마음으로 응시할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울어 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만은 안 돼.’
유빈은 입술을 힘껏 깨물었다. 울 때 울더라도 지금, 그의 앞에선 안 되었다.
“어찌하여 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대체 어찌하여!”
서늘하게 침잠해 있던 천윤의 음성에 노기가 깃들었다. 하지만 유빈은 그의 분노가 차라리 기꺼웠다. 그녀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없는 듯 데면데면 행동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화를 내며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는 게 나았다.
“그게…… 궁금하시옵니까? 하면 답을 드리겠사옵니다.”
천윤에게 고개를 숙인 채 다가간 유빈은 발끝에 그의 신발이 닿을락 말락 할 때까지 가까이 다가갔다.
“……그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당신의 곁에 있고 싶으니 내 뜻을 꺾을 생각, 하지도 말아요.”
발돋움한 유빈은 천윤의 귓가에 빠르게 속삭이고는 누가 붙잡을세라 재빨리 물러섰다.
“답도 드렸고 하니 허락하시면 이만 물러갈까 하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빈의 숨결이 닿았던 곳의 맥박이 맹렬히 뛰기 시작했다. 천윤은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다.
“……물러가도 좋다. 하나 알려 준 답이 온당치 않으니 다시 생각하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빈을 바라보는 천윤의 속은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졌다.
- 구매만족도 95.7%






- 최근 6개월, 152개 평가
- 평균 출고일 2일 이내

- [중고] 친구와 애인사이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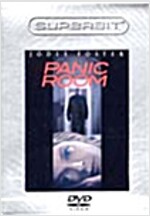
- [중고] 패닉 룸 [dts]
- 1,900원

- [중고] 6년째 연애중
- 1,500원

- [중고] 어깨너머의 연인 (2disc)
- 1,700원

- [중고] 가발 [dts]
- 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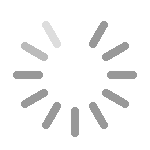



![[중고] 군왕의 비 2](https://image.aladin.co.kr/product/8393/33/cover500/892982318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