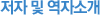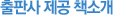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
|||||
|
|||||
|
[연신내점] 서가 단면도

|
|
첫문장 | 중요한 일은 왼손으로 한다.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일이면 더욱 그렇다. |
: 내가 가지 못한 모든 현장에 정기훈 기자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정기훈 작가는 탁월한 시선으로 잡아냈다. 단식 농성하는 노동자 얼굴에 패인 잔주름을… 탄압받는 남편의 회사 정문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손길을… 거리의 신부로 살아온 어르신의 손을… 서로 굳게 잡은 노동자의 손과 팔뚝을… 현장 곳곳에 남겨진 노동자 손길의 흔적을… 108배 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을 나는 정기훈 작가의 사진을 통해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
사진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오간 가슴 저미는 대화들이나 통계 속 숫자에 묻혀버릴 뻔했던 사실들을 이 책이 아니었다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것이다. 사진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가 친히 쓴 설명을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부채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우리들의 소중한 ‘미시사’를 기록해준 정기훈 작가에게 고맙다.
사진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오간 가슴 저미는 대화들이나 통계 속 숫자에 묻혀버릴 뻔했던 사실들을 이 책이 아니었다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것이다. 사진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가 친히 쓴 설명을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부채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우리들의 소중한 ‘미시사’를 기록해준 정기훈 작가에게 고맙다.
: 정기훈이 사진기를 들고 섰던 그 자리는 대개 아우성의 시공간이었다. 고함과 절규와 항의의 뒤섞임 속에서 내가 본 기훈은 조용히, 슬쩍 움직여가며 셔터의 단추를 눌러댔다. 그런 자리에서 셔터가 내는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 사진기 뒤에 얼굴을 붙인 채 호흡을 가다듬으며 검지손가락을 누르는 자에게 찰칵 소리는 작을 수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사진 찍는 일은 계속 소리를 듣는 일이다. 사진은 소리를 담지 않지만, 어떤 사진들은 소리를 생각게 한다.
: 정기훈은 늘 남다른 솜씨로 꽃을 틔운다. 머문 자리 자체가 척박하고 처절한 토양일 뿐인데도 탁월하게 틔워낸 그의 꽃들은 예외 없이 경탄스러울 만한 자태를 품는다. 콜텍, KTX, 쌍용차 등 해고 노동자의 단식 농성장, 광화문 세월호 천막, 일본대사관 등등 그가 주시한 토양들이 대게 그렇다. 그럼에도 그가 틔워낸 모든 꽃은 메마른 아스팔트를 촉촉이 만드는 살 내음으로 가득하다. 때론 아픔이 웃음으로, 때론 웃음이 아픔으로 승화된 그 향기는 오롯이 보는 이들의 시선마저 끌어안는다. 그래서 정기훈이 피우는 모든 꽃은 사람꽃이요, 사진이 아니다. 그의 통찰력 깊은 솜씨로 틔운 사람꽃 모두가 내 가슴에 오롯이 채워지고 있다. 정기훈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신문 2019년 12월 6일자
- 지은이 : 정기훈
 최근작 : 최근작 : | <소심한 사진의 쓸모> |
 소개 : 소개 : | 장구 치고 마당극 만드는 걸 좋아했다. 옆 사람 모습 기록해두려고 카메라를 들었다. 흥미를 느껴 밥벌이 방편으로도 삼았다. 2005년부터 매일노동뉴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일하는 사람과, 거기 얽힌 온갖 풍경에 관심이 많다. |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