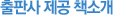안희연 (시인, 『당근밭 걷기』 저자) 
: 이 책에는 우리가 책을 읽으며 얻고자 기대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생소한 독일어 단어의 기원과 용례, 역사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몰랐던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경쾌하게 세상을 읽어내는 작가의 통찰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비좁은 나의 시야가 덩달아 확장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만만찮은 작업을 완수하는 작가의 문장이 엄청난 흡입력과 재미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작가는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자기 앞에 놓이는 단어에 빛을 주면서”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이야기를 쓴다. 책을 읽기 전에는 평면에 불과했던 단어들이 입체가 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황홀한 폭죽놀이를 본 듯 마음이 크고 넓고 다채로워졌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말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였다. 익숙한 것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은 놀라워졌다. 그 어떤 백과사전보다 흥미롭고, 그 어떤 인문학 서적보다 나를 배우게 한 책이 여기 있다.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저자) 
: 헤르더와 훔볼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민족의 독특한 이해가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이진민 작가의 신작은 일상적인 독일어에 깃들어 있는 인간과 인생 그리고 세계에 대한 독일인들의 태도와 생각,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철학자의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 시인의 따뜻한 감성, 문학과 미술 그리고 철학을 넘나드는 해박함, 유려하면서도 격조 높은 문체가 어우러진 경이로운 책이다. 독일어에 담긴 독일인들의 삶의 철학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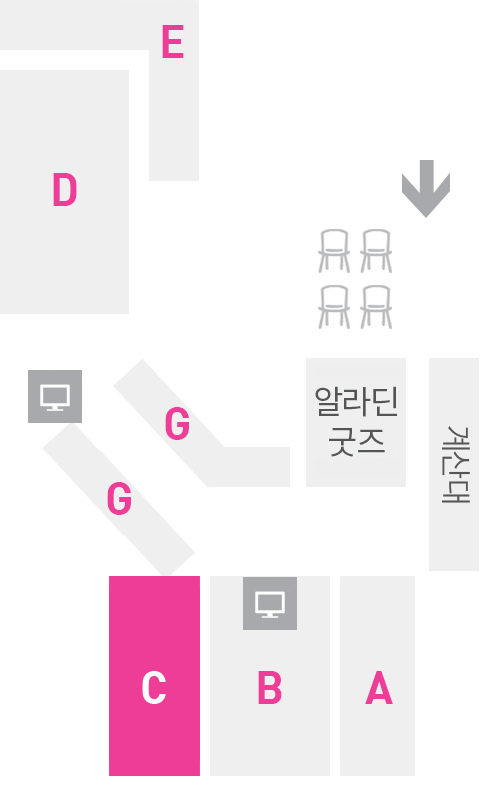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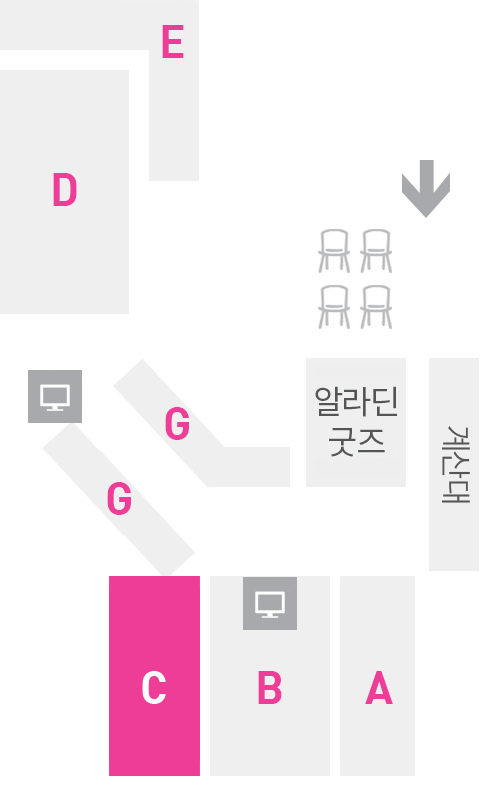
 최근작 :
최근작 : 소개 :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