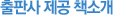황규관 (시인) 
: 박명순의 평론은 대상이 되는 작품을 윽박지르거나 무리하게 해체하지 않는다. 오직 작품의 결과 그 결에 웅크려 있는 작가의 숨소리를 더듬는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작가에게 바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시종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평론의 덕목은 당연히 평자의 심미안과 그것을 풀어내는 설득력 있는 논리에 있지만, 논리를 넘어서는 이 따뜻함은 분석이 주는 날카로움을 ‘대충’ 무마해주는 게 아니라 겸손한 바람을 비판에 얹음으로써 작가의 귀를 솔깃하게 할 것 같다. 평론도 하나의 대화 장르라면 이것은 작지 않은 장점이다. 설득과 공감은 메마른 지적보다는 청자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는 언어니까 말이다. 또 한가지 장점은, 지역에서 외롭게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먼저 내미는 손길에 있다. 이는 자칫하면 인정 비평으로 흐를 수 있지만, 박명순은 아슬아슬하게 긴장과 균형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오늘날 ‘좋아요’에 취한 세태 때문인지 이런 비평의 태도는 더 돋보인다 할 것이다. 나는 각 지역에서 창작된 문학작품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는 비평가들이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을, 박명순의 이번 평론을 읽으면서 절실하게 하게 됐다. 사는 지역을 떠나 우리 모두 ‘서울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